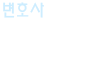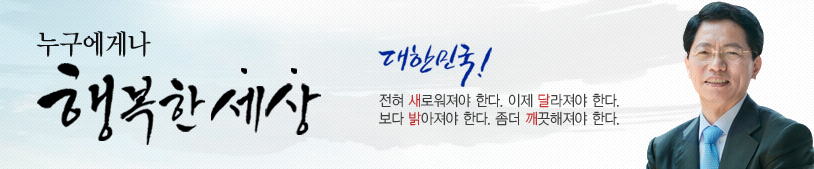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선배들 얘기로는, 단독판사 시절에는 정말 자신만만하였는데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두려워진다고 한다. 어쨌든 판사들은 운명처럼 매주 한번씩 그 천근같은 법복에 몸을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판결문과 메모가 든 두툼한 검정색 서류가방을 신주단지처럼 안고서 법관전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정경위의 “일어서십시오.”라는 구령에 따라 방청객 모두가 일어서 있다. 재판부가 입정할 때 일어서야 한다는 실정법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름다운 법정관행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관으로서는 그 기립이 두려운 것이다. 매서운 눈초리들이 재판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시하고 있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법관들은 다른 판사의 법정을 방청할 일이 없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궁금하다.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각양각색이었다. 법정문을 열기 전에 노크까지 하고 들어가는 이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목례를 하는 이도 있다. 어떤 재판장은 목례는 생략하고 법대에 앉기 전에 손을 내밀며 “여러분, 앉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한다. 방청객 모두가 다들 일어서서 노려보고 있는데 법대에 그냥 앉자니 멋쩍기도 하여 법대에 가서 앉기 전에 목례를 꾸벅 하는 분도 있다. 어차피 긴 법복을 추스르고 앉자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존경하는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내 자신 이 법복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고 혹여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선행자백(先行自白)을 하면서 말이다. 입정하기 전에 법정경위로 하여금 재판부 소개를 하게 한다는 재판장도 있다. “잠시 후 10시에 개정하는 오늘 재판은 ○○지방법원 제1민사부 민사합의재판입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은 홍길동 부장판사입니다. 배석하는 판사는 홍동길, 동홍길 판사입니다. 그리고 법대에 좌석이 왜 네 개나 있는지 궁금할 텐데 길홍동 예비판사도 이 재판에 관여합니다. 재판부가 입정할 때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서구적인데, ‘민사합의재판’ 하는 도중에 번지수가 틀린 방청인 몇 명을 바로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인이 손님에게 자신이 집 주인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반론도 물론 있다. 재판부 입정에 관한 법정관행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약간은 형식적이고 의례적(儀禮的)인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은 법복을 입고 태극기가 걸려 있는 법정에 들어가는 이상, 바로 법대에 앉아 느닷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존경심 발로의 일환이든 아니든 겸손하게 목례를 하고 앉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 홍길동 판사입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 다음 오늘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부끄럽게도 필자는 그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를 못하고 재판을 바로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4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선배들 얘기로는, 단독판사 시절에는 정말 자신만만하였는데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두려워진다고 한다. 어쨌든 판사들은 운명처럼 매주 한번씩 그 천근같은 법복에 몸을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판결문과 메모가 든 두툼한 검정색 서류가방을 신주단지처럼 안고서 법관전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정경위의 “일어서십시오.”라는 구령에 따라 방청객 모두가 일어서 있다. 재판부가 입정할 때 일어서야 한다는 실정법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름다운 법정관행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관으로서는 그 기립이 두려운 것이다. 매서운 눈초리들이 재판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시하고 있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법관들은 다른 판사의 법정을 방청할 일이 없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궁금하다.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각양각색이었다. 법정문을 열기 전에 노크까지 하고 들어가는 이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목례를 하는 이도 있다. 어떤 재판장은 목례는 생략하고 법대에 앉기 전에 손을 내밀며 “여러분, 앉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한다. 방청객 모두가 다들 일어서서 노려보고 있는데 법대에 그냥 앉자니 멋쩍기도 하여 법대에 가서 앉기 전에 목례를 꾸벅 하는 분도 있다. 어차피 긴 법복을 추스르고 앉자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존경하는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내 자신 이 법복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고 혹여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선행자백(先行自白)을 하면서 말이다. 입정하기 전에 법정경위로 하여금 재판부 소개를 하게 한다는 재판장도 있다. “잠시 후 10시에 개정하는 오늘 재판은 ○○지방법원 제1민사부 민사합의재판입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은 홍길동 부장판사입니다. 배석하는 판사는 홍동길, 동홍길 판사입니다. 그리고 법대에 좌석이 왜 네 개나 있는지 궁금할 텐데 길홍동 예비판사도 이 재판에 관여합니다. 재판부가 입정할 때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서구적인데, ‘민사합의재판’ 하는 도중에 번지수가 틀린 방청인 몇 명을 바로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인이 손님에게 자신이 집 주인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반론도 물론 있다. 재판부 입정에 관한 법정관행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약간은 형식적이고 의례적(儀禮的)인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은 법복을 입고 태극기가 걸려 있는 법정에 들어가는 이상, 바로 법대에 앉아 느닷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존경심 발로의 일환이든 아니든 겸손하게 목례를 하고 앉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 홍길동 판사입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 다음 오늘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부끄럽게도 필자는 그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를 못하고 재판을 바로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4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