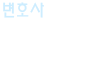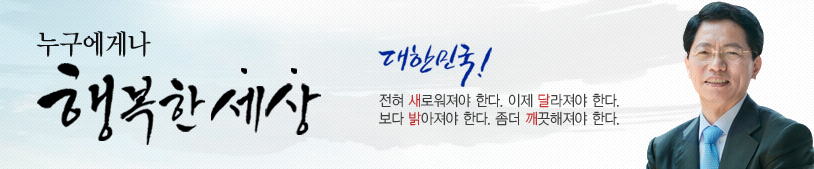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아름다운 뒷모습
정기인사가 있을 때면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분들의 웃는 앞모습도 보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사명령의 행간에는 사직하는 분 개개인의 사연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민도 아로새겨져 있다. 떠나는 분들을 ‘석반하반(惜半賀半)’의 심정으로 보내는, 남아 있는 자의 법복의 무게가 오늘 따라 천근같이 어깨를 내리누른다. 그 무거운 법복의 고뇌와 고독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사법부를 묵묵히 지켜온 A판사도 다른 분들과 함께 용퇴하였다. 약관(弱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어언 35년, 판사로만 30년 세월 동안 낡은 구두를 신고 법원을 드나들었다. A판사는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두터운 신망을 쌓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명예이자 삶의 지표라는 생각에 충실하였다. 권력은 그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니 미련을 갖지 말며, 돈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휘발유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이면 족하다는 생각에 동감한 그는,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판사직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직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때로는 찬바람 부는 벌판에 외롭게 서서 옳은 판단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사회정의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그는 권력의 편도 시민의 편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옳은 자와 정당한 자의 편에 서고자 하였고, 재판의 본령은 당사자와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있다는 철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는 상식을 존중하는 고도의 균형감각을 가진 ‘정평청명(正平淸明)’한 전형적인 판사였다. 그럴진대 A판사가 정년까지 우리 법원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후배의 욕심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불명예퇴직이 많은 때에 스스로 퇴장을 선택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뒷모습이 아름답다. 인생이 이 땅에서는 모두 나그네이듯이, 판사직 또한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때가 되면 훌훌 털고 떠나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 나그네의 길이 아닌가. 문제는, 관직의 높이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실 된 나그네로서 공직에 머물면서 주인에게 감동을 주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가일 뿐이다. 떠나는 상머슴이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과연 후일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준비하는 자세로 법관직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면서, 멀리서나마 A판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본다. <2002년 2월 7일자 법률신문> 내가 당시 글에서 ‘A판사’로 표현한 분은 2002년 2월 사직한 김대환 전 서울고등법원장이다. 내가 1998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에서 모셨다.
정기인사가 있을 때면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분들의 웃는 앞모습도 보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사명령의 행간에는 사직하는 분 개개인의 사연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민도 아로새겨져 있다. 떠나는 분들을 ‘석반하반(惜半賀半)’의 심정으로 보내는, 남아 있는 자의 법복의 무게가 오늘 따라 천근같이 어깨를 내리누른다. 그 무거운 법복의 고뇌와 고독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사법부를 묵묵히 지켜온 A판사도 다른 분들과 함께 용퇴하였다. 약관(弱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어언 35년, 판사로만 30년 세월 동안 낡은 구두를 신고 법원을 드나들었다. A판사는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두터운 신망을 쌓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명예이자 삶의 지표라는 생각에 충실하였다. 권력은 그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니 미련을 갖지 말며, 돈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휘발유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이면 족하다는 생각에 동감한 그는,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판사직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직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때로는 찬바람 부는 벌판에 외롭게 서서 옳은 판단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사회정의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그는 권력의 편도 시민의 편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옳은 자와 정당한 자의 편에 서고자 하였고, 재판의 본령은 당사자와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있다는 철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는 상식을 존중하는 고도의 균형감각을 가진 ‘정평청명(正平淸明)’한 전형적인 판사였다. 그럴진대 A판사가 정년까지 우리 법원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후배의 욕심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불명예퇴직이 많은 때에 스스로 퇴장을 선택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뒷모습이 아름답다. 인생이 이 땅에서는 모두 나그네이듯이, 판사직 또한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때가 되면 훌훌 털고 떠나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 나그네의 길이 아닌가. 문제는, 관직의 높이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실 된 나그네로서 공직에 머물면서 주인에게 감동을 주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가일 뿐이다. 떠나는 상머슴이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과연 후일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준비하는 자세로 법관직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면서, 멀리서나마 A판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본다. <2002년 2월 7일자 법률신문> 내가 당시 글에서 ‘A판사’로 표현한 분은 2002년 2월 사직한 김대환 전 서울고등법원장이다. 내가 1998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에서 모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