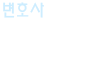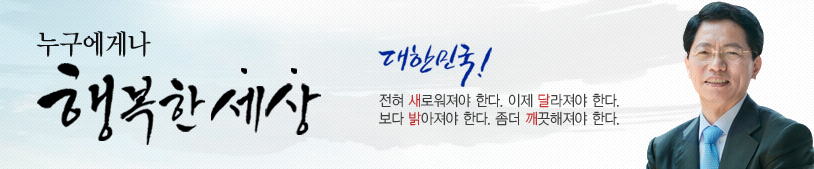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
중세시대에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신학, 의학, 법학과만 있었다.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도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은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고, 타인의 삶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 저들의 절망과 환희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봉사(奉仕)와 소명(召命)의 직업이다. 세 직업 중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그래서 의사나 목사는 스승 사(師)자를 쓴다. 성직자와 의사는 영혼이든 육체든 인간의 병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니 사실 고맙다는 인사만 받으면 된다. 교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여서,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백지(白紙) 위에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넣고 채색하면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는다. 한때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하얀 가운 대신에 시퍼런 죄수복을 입겠다고 자청하면서 집단휴폐업을 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의사가 가운을 벗어 던지면 그 순간 존재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은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우선 이름부터가 일에 파묻혀 살라는 것인지 스승 사(師)자가 아닌 일 사(事)자를 붙여 놓았다. 재판에는 항상 양 당사자가 있다. 이긴 쪽은 명 재판을 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이길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무능한 판사라고 비아냥댈 것이다. 재판에서 진 쪽은 무조건 미워한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그 판사가 그것을 몰라주니 어리석은 판사라고 아쉬워하고, 심지어는 이긴 쪽하고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까지 한다. 심한 경우 법정에서 말로, 진정서로, 전화로 형편없는 욕설을 하기도 한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런지 법관들이 의사나 성직자보다 평균수명이 길다고 한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남의 분쟁에 끼어들게 해놓고 국민들 대신 죄인들에게 욕먹어 가면서 형을 선고하라고 만든 직업이 판사인가 보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의 가장 큰 장점은 판사가 욕을 안 먹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판사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다. 국민 스스로 재판을 하였으니 그 재판의 당․부당(當․不當)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결코 판사에게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재판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참심제나 배심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재판업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다. 정신과의사 정혜신 박사는 <남자 대 남자>라는 책에서 감격스럽게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집단 중의 하나는 법관.” 이라고 하였다. 법관이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위임에 따라, 더 크게는 신의 위임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는 것이 법복일진대, 그 법복 속에 자신을 꽁꽁 숨기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만 한다면 그까짓 욕을 좀 먹는다고 한들 무슨 대수랴 하는 생각이다. 판사가 입는 법복은 참으로 무거운 가운임에 틀림없다. <2002년 5월 2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한적인 배심재판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세시대에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신학, 의학, 법학과만 있었다.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도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은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고, 타인의 삶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 저들의 절망과 환희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봉사(奉仕)와 소명(召命)의 직업이다. 세 직업 중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그래서 의사나 목사는 스승 사(師)자를 쓴다. 성직자와 의사는 영혼이든 육체든 인간의 병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니 사실 고맙다는 인사만 받으면 된다. 교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여서,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백지(白紙) 위에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넣고 채색하면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는다. 한때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하얀 가운 대신에 시퍼런 죄수복을 입겠다고 자청하면서 집단휴폐업을 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의사가 가운을 벗어 던지면 그 순간 존재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은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우선 이름부터가 일에 파묻혀 살라는 것인지 스승 사(師)자가 아닌 일 사(事)자를 붙여 놓았다. 재판에는 항상 양 당사자가 있다. 이긴 쪽은 명 재판을 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이길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무능한 판사라고 비아냥댈 것이다. 재판에서 진 쪽은 무조건 미워한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그 판사가 그것을 몰라주니 어리석은 판사라고 아쉬워하고, 심지어는 이긴 쪽하고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까지 한다. 심한 경우 법정에서 말로, 진정서로, 전화로 형편없는 욕설을 하기도 한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런지 법관들이 의사나 성직자보다 평균수명이 길다고 한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남의 분쟁에 끼어들게 해놓고 국민들 대신 죄인들에게 욕먹어 가면서 형을 선고하라고 만든 직업이 판사인가 보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의 가장 큰 장점은 판사가 욕을 안 먹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판사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다. 국민 스스로 재판을 하였으니 그 재판의 당․부당(當․不當)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결코 판사에게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재판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참심제나 배심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재판업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다. 정신과의사 정혜신 박사는 <남자 대 남자>라는 책에서 감격스럽게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집단 중의 하나는 법관.” 이라고 하였다. 법관이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위임에 따라, 더 크게는 신의 위임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는 것이 법복일진대, 그 법복 속에 자신을 꽁꽁 숨기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만 한다면 그까짓 욕을 좀 먹는다고 한들 무슨 대수랴 하는 생각이다. 판사가 입는 법복은 참으로 무거운 가운임에 틀림없다. <2002년 5월 2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한적인 배심재판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